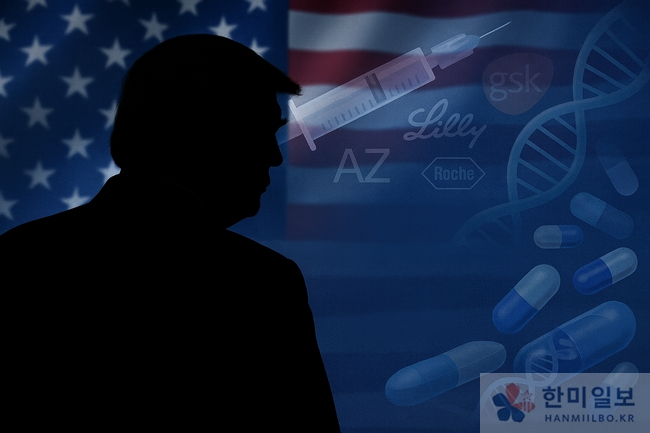 글로벌 제약사 3,500억 달러 투자에 힘 받는 트럼프 무역정책. 한미일보 그래픽
글로벌 제약사 3,500억 달러 투자에 힘 받는 트럼프 무역정책. 한미일보 그래픽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에 앞다투어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의약품 관세 위협 속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내 제조·연구개발(R&D) 투자 약속을 합치면 2030년까지 3,500억 달러 이상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단순한 협상용 압박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실제 기업별 계획은 구체적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GSK는 향후 5년간 미국 내 연구개발과 공급망 인프라에 300억 달러를 투입하고, 펜실베이니아주에 12억 달러 규모의 신공장을 세운다. 미국 엘리 릴리(Eli Lilly)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50억 달러 신공장을 포함해 총 27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외에도 스위스 로슈(Roche), 영국계 다국적사 아스트라제네카(AZ)가 잇달아 현지 생산과 연구 인프라 확대를 발표했다. 가디언은 지난 7월 보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2030년까지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있다.
그는 수입 의약품에 대해 “최대 250% 관세”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가디언도 “해외에서 제조된 약품은 더 이상 값싸게 들어올 수 없다”며 200% 관세 위협을 경고한 사실을 전했다. WSJ는 관세 압박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내 고용과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메시지와 결합돼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한국 제약산업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한국은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내수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처음부터 글로벌 수출 의존 구조로 성장해왔다. 셀트리온의 램시마, 허쥬마, 트룩시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엔브렐·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등은 매출 대부분을 해외에서 거둔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최근 기준 매출의 98.8%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91% 이상을 해외 매출로 기록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매출 비중은 연간 25.8% 수준에서 최근 분기에는 43%까지 급등했다.
따라서 미국이 현지 생산을 강제하거나 관세 장벽을 높일 경우, 한국 제약의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 구조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셀트리온이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을 검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 법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목표가 협상용 카드보다 미국 제조업 부흥에 더 가깝다”며 “관세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무역전쟁의 본질은 기술 패권 경쟁”이라며, 한국이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글로벌 제약사들의 미국 투자 약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산업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제약산업 역시 이 거대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중심의 수출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와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이중 압력 속에서 뼈아픈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무역정책 #글로벌제약사 #3500억달러투자 #WSJ #로이터 #가디언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