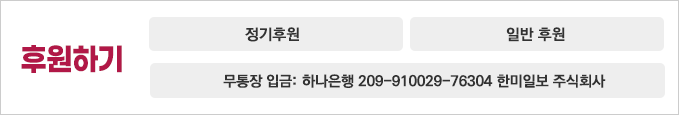“협상이었는가, 편입이었는가.” 미·일 MOU와 조항·문장 구조까지 거의 일치하는 한·미 MOU. ‘정부 발표가 절반은 거짓’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픽=한미일보]
“협상이었는가, 편입이었는가.” 미·일 MOU와 조항·문장 구조까지 거의 일치하는 한·미 MOU. ‘정부 발표가 절반은 거짓’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픽=한미일보]
정부는 이번 한·미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협약(MOU)을 두고 “투자 의무는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미래 공급망을 주도할 것이며 관세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미일보>가 확보한 미·일 MOU 전문과 한·미 MOU 영문본을 비교해 본 결과, 이번 합의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쟁취한 구조가 아니라 미국이 먼저 일본과 체결해 설계해 둔 산업·관세 템플릿(template·표준화된 서식)에 한국이 그대로 편입된 형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협상은 없었고, 설계는 이미 끝나 있었다. 한·미 간 발생한 것은 조정이 아니라 수용이었다.
한·미 MOU와 미·일 MOU는 문장 구조와 핵심 조항, 심지어 조항 번호까지 사실상 동일하다. 투자 규모만 일본 5500억 달러, 한국 3500억 달러로 다를 뿐 △법적 구속력 없음 △투자 미이행 시 Catch-up(미달분 소급 적용) 정산 △관세 부과 가능 △where feasible(가능한 한) 조건부 진출 같은 핵심 조항은 단어 수준까지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새로운 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업 프론트(Up-Front) 설계도’에 숫자만 바꿔 서명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과 먼저 MOU를 체결해 산업‧관세‧투자 연동 구조를 고정해 두었고 그 동일한 문장을 한국 정부에 제시했을 가능성이 문건 비교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다.
정부는 “투자 의무 없음”을 근거로 해당 MOU가 강제가 아닌 자율적 합의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사실의 절반에 불과하다.
문서에는 “This MOU does not create legally binding rights or obligations.(본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나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바로 뒤 제9조(Section 9)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the United States may impose tariff rate or rates on Korean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t the rat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미국은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투자는 강제가 아니지만, 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포함한 경제적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구조다. 즉 “법적 의무는 없지만 경제적 강제는 존재하는” 설계다. 이것이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핵심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투자 미이행 시 수익 배분이 불리하게 조정되는 Catch-up Amount 조항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Catch-up은 위약금은 아니지만 투자 지연 시 배당과 수익 배분을 불리하게 조정하는 실질적 패널티로 작동한다. 투자는 선택이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구조는 미·일 MOU와 한·미 MOU 모두에 동일하게 등장하며 위치와 표현까지 일치한다.
정부는 또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보장받았다”고 발표했지만 문서의 실제 문장은 다음과 같다.
“…the United States will support Korean participation where feasible and available.”
(미국은 가능하고 가용한 범위 내에서 한국의 참여를 지원할 것이다.)
이는 “조건이 맞는 경우에 한해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확정된 약속이 아니라 재량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국제협정에서 where feasible은 의무 회피 조항으로 널리 쓰인다.
결국 정부는 관세 트리거가 달린 조항은 ‘선택적’이라 말하고, where feasible(가능한 범위 내에서)로 한정된 조항은 ‘보장’이라 발표한 셈이다.
 한·미-미·일 간 무역협정 MOU 비교 분석. [그래픽=한미일보]
한·미-미·일 간 무역협정 MOU 비교 분석. [그래픽=한미일보]
이번 MOU의 본질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구조 설계에 있다.
미국은 산업·관세 체계를 국가마다 새로 설계하는 대신 하나의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 놓은 뒤, 여기에 상대 국가를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를 업프론트 설계라고 한다. 협상 전에 구조를 고정해 놓고 상대국에는 ‘참여 여부’만 선택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일본이 선행 실험 대상이었고, 한국은 뒤따라 동일한 구조에 편입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짜 의미의 협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형식은 양자 MOU였지만 실제는 설계된 체제로의 귀속이었다.
이 구조는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배치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미국은 ‘규범‧투자‧관세’를 연동하는 새로운 산업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에 이어 한국도 그 주요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더 큰 문제는 심지어 결과에 대해서도 절반의 거짓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투자 의무 없음’만 공개했고 가장 중요한 조항들, 즉 관세 부과 가능성, Catch-up 정산 조건, where feasible로 표현된 조건부 진출에 대한 것은 발표에서 빠져 있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무 여부’가 아니라 ‘구조적 설계’에 대한 정보다. 정부의 설명을 절반은 거짓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합의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한다면, 그것은 ‘한·미 협상’이 아니라 ‘미국이 설계한 산업·관세 체제로의 귀속’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이 설계한 구조에 들어간 것이며, 우리가 새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는 ‘의무 없음’이라는 문장만 보여줬지만 실제 문서에 명시된 선택지의 구조는 “투자하면 관세를 면해 주겠다,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MOU를 이해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확한 묘사다.
이번 문서는 ‘투자 약속’이 아니라 ‘관세 레버리지’ 문서이며,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설계된 유인 구조’다. 그리고 질문은 하나로 귀결된다.
“우리는 협상한 것인가, 아니면 설계된 체제에 편입된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때 비로소 국익을 위한 평가와 교정이 가능해진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본질은 빠뜨린 채 ‘특별법 제정과 비준 동의’를 두고 다투고 있다.
※ 참고자료
한미 무역협정 MOU 한글 및 영문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196/view?mno=&pageIndex=2&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미일 무역협정 MOU 영문본
https://www.worldtradelaw.net/document.php?id=tradedisputetracker/Japan-US-Investment-MOU-Sep4.pdf&mode=download
허드슨연구소 Financing the $550 Billion Strategic Investment Fund: An Update
https://www.hudson.org/economics/financing-550-billion-strategic-investment-fund-update-william-chou
#업프론트설계 #한미협정 #관세트리거 #CatchUp #미일MOU #투자관세연동 #이재명정부 #통상외교검증 #문서비교 #한미일보탐사
 캐시 파텔 美 FBI 국장, 일·한·중 순차방문… 범죄대응 공조 강화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직후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FBI가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텔 국장은 전 세계 최전선 활동을 지원하고 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초 일본 도쿄에 이어 한국 서울과 중국 베이징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직후다. FBI는 파텔 국장이 한일중 3국 지역의 법 집행 및 정보 파트너와 더욱 협력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대화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캐시 파텔 美 FBI 국장, 일·한·중 순차방문… 범죄대응 공조 강화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직후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FBI가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텔 국장은 전 세계 최전선 활동을 지원하고 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초 일본 도쿄에 이어 한국 서울과 중국 베이징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직후다. FBI는 파텔 국장이 한일중 3국 지역의 법 집행 및 정보 파트너와 더욱 협력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대화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단독] 韓‧日 영문 MOU 비교… “정부 발표, 절반은 거짓말”
[단독] 韓‧日 영문 MOU 비교… “정부 발표, 절반은 거짓말”
 김용범, 전세사는 딸에 갭투자 제기하자 발끈…與까지 나서 만류
김용범, 전세사는 딸에 갭투자 제기하자 발끈…與까지 나서 만류
 ‘서부지법 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경찰 출두
‘서부지법 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경찰 출두
 정용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美방문 환영행사 참석
정용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美방문 환영행사 참석
 디즈니-유튜브TV, 2주간 분쟁 끝에 재계약 합의…방송 재개
디즈니-유튜브TV, 2주간 분쟁 끝에 재계약 합의…방송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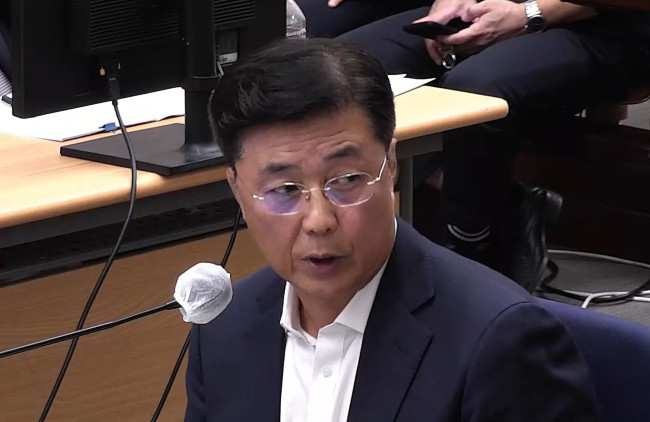 [포토] 증인 출석한 홍장원
[포토] 증인 출석한 홍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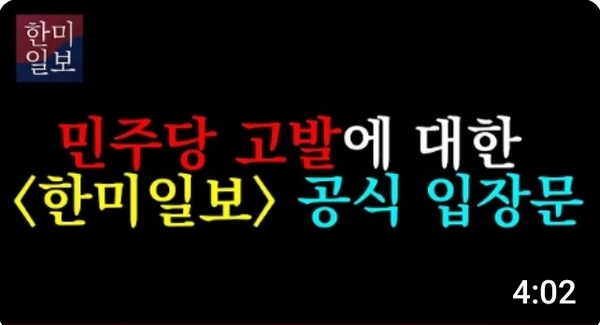 [영상]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
[영상]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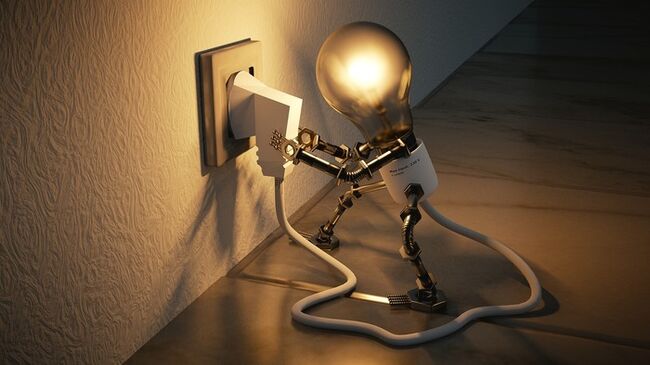 [신동춘 칼럼] 과학과 실용으로 도전을 극복해야 - 에너지와 팬데믹 사례
[신동춘 칼럼] 과학과 실용으로 도전을 극복해야 - 에너지와 팬데믹 사례

 목록
목록